조선 말기의 몰락과 개신교가 전한 저항의 복음
조선 말기, 우리는 나라를 잃기 직전의 혼란한 시대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고종과 민비의 사치와 매관매직, 그리고 그 속에서 개신교가 어떻게 민중을 깨우고 주권의식을 심어주었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고종과 민비의 씀씀이는 얼마나 심각했을까?
구한말 조선의 재정은 그야말로 바닥이었습니다.
황현의 《매천야록》에 따르면, 대원군이 10년간 모아둔 국고를 민비가 1년 만에 탕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조선의 국가 예산은 480만 냥이었는데, 민비가 외국인 언더우드 여사에게 준 축의금만 100만 냥에 달했습니다.
고종 또한 자신의 즉위 40주년과 51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무려 100만 원을 썼고, 그 해 국가 예산은 759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이게 나라였을까요?
매관매직: 벼슬을 파는 왕과 왕비
국고가 바닥나자 고종과 민비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입니다.
왕과 왕비가 직접 벼슬을 돈 받고 파는 매관매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해엔 호조판서 자리를 24번이나 팔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은 더 이상 백성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고종의 사유물, 즉 가산제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조선의 몰락 속에서 등장한 개신교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빛은 있었습니다.
바로 개신교 복음의 유입이었습니다.
개신교는 단지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압받던 조선 민중에게 주권의식과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주는 메시지였고, 실제로 3.1운동의 불씨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개신교인은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었지만,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16명이 개신교인이었습니다.
반면, 유교 학자나 성리학 선비들은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개신교와 종교개혁의 저항정신
개신교(Protestant)는 ‘항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세 교황의 권위에 항거하며 성경을 대중에게 돌려준 존 위클리프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링컨이 말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는 위클리프가 성경 번역본 서문에 남긴 문장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정신은 선교사를 통해 조선에 들어와 주권재민의 개념을 심어주었습니다.
백정이 장로가 된 이야기: 박성춘과 박서양
조선 최초의 서양의사 박서양의 아버지, 박성춘은 백정이었습니다.
콜레라에 걸려 죽어가던 그를 선교사 무어가 치료했고, 무어는 고종의 주치의 에비슨을 데려와 박성춘을 살려냅니다.
박성춘은 그 은혜에 감동해 교회에 출석하고, 나중에는 장로로 선출됩니다.
하지만 백정이 장로가 되는 것을 양반들이 받아들이지 못해 양반 신자들은 분리되어 안동교회를 설립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교회가 불타자, 백정의 승동교회와 양반의 안동교회는 다시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평등의 복음은 그렇게 신분의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개신교는 조선 민중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
개신교 선교사들은 단지 성경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치료하고, 먹였습니다.
이 네 가지 사역은 조선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 “하나님 아래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
- “백성은 왕의 소유물이 아니다.”
-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마무리: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조선 말기, 나라가 무너지고 있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조선 땅에 복음을 심으셨습니다.
그 복음은 단지 종교가 아니라, 민중의 의식을 깨우고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리는 진정한 ‘개혁의 불씨’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복음을 기억하고, 그 안에 담긴 평등, 저항, 주권, 존엄의 가치를 다시 새겨야 할 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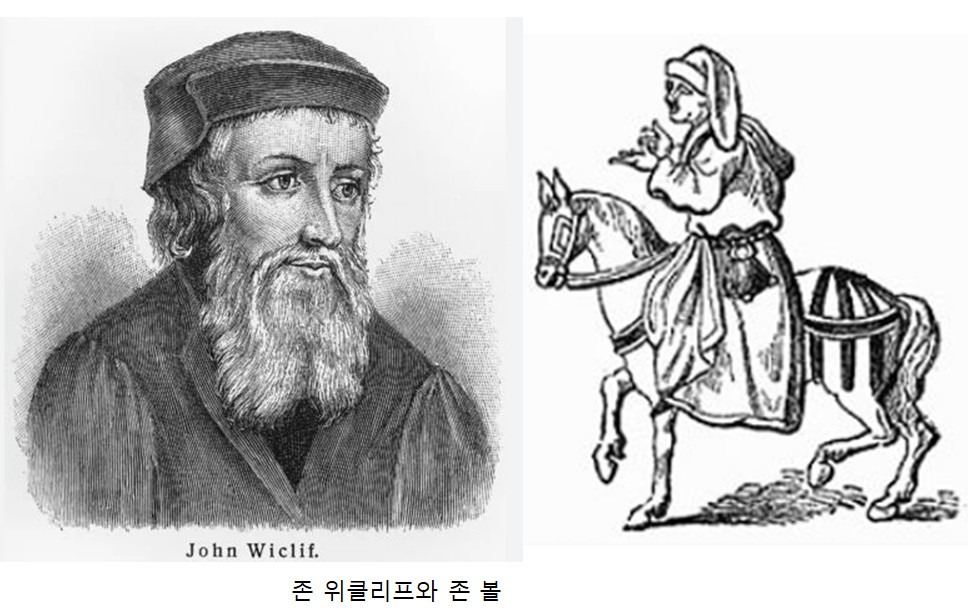
'믿음의 역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구한말 도덕 혁명 복음의 빛 (2) | 2025.04.23 |
|---|---|
| 대동강에 뿌려진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만들다. (1) | 2025.04.17 |
| 한반도에 내린 성령의 은혜 (0) | 2025.03.17 |